제180회 한국산문 수필 공모전에서 ‘사라져 간 한 시절의 풍속이나 유물, 음식, 의상, 축제 등에 대한 향수는 결코 편의주의적인 물질문명이 이룩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공동체의 축제처럼 야릇한 영혼의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다’라고 평한 작품 ‘방앗간 옆 정미소’로 당선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해 ‘방앗간 옆 정미소’는‘ 작가의 유년 시절의 추억담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삶이 새겨진 서정미가 돋보인다. 그간 이 작가가 쓴 여러 글에는 무척 발랄한 현대적인 소재로서 보다 흥미있는 작품들도 많지만 구태여 이 글을 선택한 것은 작가적인 자세가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 내린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경지라면 어떤 주제나 소재도 너끈히 다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심사평이 적혀있다.
‘어린 시절 피터팬에 빠져 책 읽기를 시작했고 온종일 책만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투정 부렸던 섬 소녀가 중년이 되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등단하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연했던 상상이 이루어져 꿈만 같습니다.’라고 밝히며‘부족하기만 한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신 존경하는 임헌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여 따듯하고 맑은 글로 마음을 헹구어주는 작가의 길을 한발 한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등단소감을 밝혔다.
방앗간 옆 정미소 / 김은미
정미소가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쓰임새가 다 된 정미소가 이색적인 카페, 맥줏집, 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등으로 성업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미소에서 쓰던 기계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도정 작업과 관련된 용품과 농기구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이에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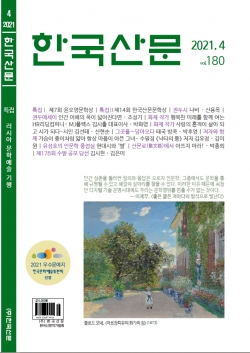
고향의 옆 동네인 대척 마을에 정미소와 나란히 있던 방앗간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곳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빨간 양철지붕과 땅을 울리는 장엄한 기계 소리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 안의 분주한 풍경들이 그려져 기분 좋았던 곳. 곡식을 도정하던 정미소와 떡도 하고 고춧가루도 빻았던 방앗간이 한곳에 있었다.
가을걷이에 바쁜 엄마는 열두 살배기인 내게 방앗간 가는 일을 덜컥 맡기고는 밭으로 갔다. 덜컹거리는 방앗간 경운기에 나락 가마니와 함께 실려 가며 느꼈던 걱정과 두려움은 가득 실은 나락 가마니보다 더 무거웠다.
명절 때는 동네 친구들과 방앗간에서 떡가루를 빻아왔다. 찹쌀은 빻을 때 물을 섞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신신당부했고, 멥쌀에는 물을 적당히 섞으라고 하였는데 내가 물을 많이 섞었던 모양이다. 엄마는 잘게 썬 무를 넣은 무 떡을, 나는 단 호박 넣은 호박떡을 좋아했지만, 떡가루가 너무 질어져서 안 되겠다며 콩만 섞었던 일도 있었다.
가마솥 위에 시루를 얹어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이 올린 다음 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쌀가루를 반죽하여 시루 빼미를 꼼꼼히 했다. 나는 떡이 맛있게 잘 익기를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장작불을 땠다. 떡이 다 되자 엄마가 멥쌀 떡이 찰떡처럼 찰기가 있어서 더 맛있다고 내게 떡을 한입 떼어 주며 박꽃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후부터 떡 쌀 빻는 일은 아예 내 몫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멥쌀가루에 물 섞는 비율은 여전히 어려웠다.
설이 되면 가래떡 뽑는 일도 내 몫이었다. 새벽같이 방앗간에 갔지만 줄서기를 해야 했다. 한나절은 그곳에서 보냈으리라. 차례를 기다리다 쌀가루를 빻고 그걸 찐 다음 떡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즐거운 기다림이었다. 떡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다. 방앗간 가는 일을 좋아했다. 고춧가루도 빻고 참기름도 짜고, 그중에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것은 참기름 짜는 일이었다.
참기름을 짜는 집은 면내(面內) 읍동 마을 한 곳인데, 같은 반 영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집이었다. 추수가 끝난 후여서인지 그곳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지루한 시간을 같이 간 친구와 그림자 밟기며 핀 따먹기 놀이를 하며 기다렸다. 영기도 다 짜낸 깻묵을 옮긴다거나 분주히 움직이며 그의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쑥스러워 서로가 외면했다.
마을에 디딜방아가 있었다. 동짓날에는 쌀 두어 되를 디딜방아로 찧었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 나를 엄마가 불러 동생과 함께 아랫집 희순이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떡쌀을 찧어야 한다며 옆구리에 광주리를 끼고 있었다. 방앗간도 아닌데 어떻게 찧느냐고 종알거리며 따라갔더니, 그 집 곳간 옆에는 교과서에서 봤던 디딜방아가 있었다. 우리는 처음 본 신기한 물건을 여기저기 만지며 서로 찧겠다고 다투었는데, 엄마는 제비 꼬리처럼 두 가닥으로 길게 갈라진 방아채에 한발씩 올리고 천장에 매달려있는 줄을 잡고 같이 살살 디디는 거라고 일러주었다. ‘쿵덕쿵덕’ 소리에 놀랐다가 이내 깔깔거리고는 신중하게 박자를 맞추며 발을 디뎠다. 엄마는 돌확 앞에 앉아 찧어지는 쌀을 저어가며 조심하라고 일렀다. 채에 곱게 거른 쌀가루로 새알을 빚어 쫄깃한 동지 팥죽을 끓였다. 그때 먹고 남은 팥죽은 최고의 간식이 되었다. 차갑게 굳어 있는 팥죽을 숟가락 자국이 드러나게 한 숟가락씩 떠먹던 그 맛은 긴긴 겨울밤의 별미였으니.
80년대 중반쯤 아버지는 가정용 정미기를 집에 들였다. 더는 정미소집 경운기를 부르지 않아도 되었고 쌀이 떨어질라치면 창고에 있는 정미기로 바로 찧어서 짓는 밥맛은 일품이었다.
아버지는 수확한 나락을 직접 도정하여 도회지의 자식들에게 보내주시고는 그해에 할 일을 다 하신 듯 목소리에 맑은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가족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정미기도 지금은 주인을 잃고 고철 신세가 되어있다.
한 시대의 풍요를 상징했던 정미소가 최신 설비를 갖춘 미곡종합처리장이 들어선 후 구시대의 유물처럼 방치된 모습이 내심 안타까웠었다. 오래되어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낡고 허름한 공간이 되어버린 추억의 정미소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등으로 재탄생되었다는 기발한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사에서 본 강릉 정미소 카페를 한달음에 달려가 보고 싶었다. 도정 기계를 돌리는 동력 벨트가 높은 천장에 있는 정미소 카페에서, 달달한 차를 마시며 향수에 취해도 보고 책도 읽으며 추억을 만들고 싶다. 맨얼굴을 찾게 되는 날 다정한 벗들과 함께 떠나봐야겠다.
바다로 둘러싼 내 고향 신안의 정미소에도 예쁜 카페와 북 카페로 거듭나기를 바래본다. 참새가 방앗간에 모이듯 고향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한동안 멈추어져 있던 정미소에 쿵덕쿵덕 디딜방아 찧던 소리처럼 삶의 동력이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김은미
전남 신안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학

